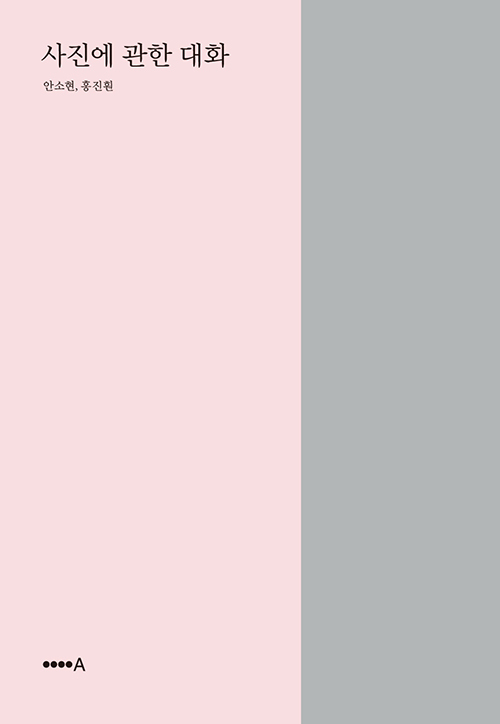
사진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좋은 사진을 찍지는 못하는 듯하다. 잘 찍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잘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리저리, 그리고 열심히 찍어본다. 때론 좋은 강좌라 생각되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잘 찍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연장 탓을 한다. 목수가 연장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진을 찍는 사람이 카메라 탓을 하면 안 된다지만 그래도 핑계를 찾고 싶은 얄팍한 심리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의 카메라보다 더 좋은 카메라를 사고 싶다는 생각에 이른다. 그리고 이런저런 장비만 잔뜩 들이며 장비병에 걸린다.
조금 더 사진을 배워보면 달라질까? 라는 생각에 이런저런 사진과 관련된 책들을 사서 본다. 무겁고 딱딱해 보이지만 그래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책장을 들춰본다. 아직 개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에서 막힌다. 이런저런 책들을 뒤적여 가며 그래도 한 권을 다 일고 다시 사진을 찍어보지만 결국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고 좌절할 수는 없다. 다시 또 무언가가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책들을 뒤진다. 그러다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된다. “본다는 것의 의미” 라는 책을. 꽤 유명한 책이다. 사진을 찍는 다는 것의 의미, 즉 대상이나 사물, 또는 인물을 보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엇을 찍으려하기보다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사진을 찍는 기술, 테크닉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사진을 찍는 단순한 행위 이상을 넘어설 수 없으며, 자신의 사진을 만드는 것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세상을 또는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다.
단순하며 쉬워 보인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듯 기대감에 부풀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무언가를 찍으려하면 그것이 무언지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생하게 말하자면 나의 철학은 무언인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사회, 사물, 인간, 역사 등등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을 자신의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을 찍으면서 자신이 만족하고자 한다면 말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장소, 시간, 대상 등을 하나의 선 또는 입체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진이라는 ‘물질’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기술과 테크닉이 가미된다면 전혀 새로운 사진이 나올 수 있으며, 하나의 시간과 공간에 머무는 사진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아니 보면 볼수록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사진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과정. 그 과정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괜찮은 사진가와 어울리며 옆에서 그 과정과 고민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나의 과정과 이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러한 사진가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신의 고민을 잘 드러내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답답함들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한동안 사진을 찍지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귀찮다는 생각도 들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다. 그렇게 한참을 지내다 얼마 전 읽을거리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사진에 관한 대화”
솔직히 처음 이 제목을 읽었을 때만 하더라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조금은 거창하고 개념적인 사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사진책들은 대부분 이렇다. 다만 우리의 아픈 기억, 2014년 4월의 기억을 사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에 궁금해졌다. 어떻게 찍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하던 사진의 이해를 조금은 정리할 수 있었고, 새롭게 사진을 바라보는 시각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오히려 화려함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의 시각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며, 무엇을 읽고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잡을 수 있었다. 결국 다행이라는 생각에 이르면서 오랫동안 장롱 속에 쳐박아두었던 카메라가 떠올랐다. 그리고 나만의 주제, 나만의 방식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이 이어졌다.
감성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에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동력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양극단 사이를 지루하게 오가다 저항에 힘을 잃곤 하는 진자 운동과는 다른 힘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남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것은 또 다른 진자 운동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궤도를 벗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P.10
제가 하는 일이라곤 제 몸과 머리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꺼내 제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들일 뿐이어서 이기적인 것 같아요.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전시를 만들고, 다 마찬가지죠. 제 감각과 사고를 물질화하고 타자화해 다시 제 앞에 두는 과정 자체가 저에겐 가장 흥미롭고 긴장되는 일이에요. P.25
P.S. 상당히 많이 얇은 책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쉬이 읽어내려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글자, 한 문장, 그리고 앞뒤의 맥락을 꽤 오랫동안 고민하며 읽었던 책이다. 그렇다고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다.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그 의미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곱씹어봐야 한다. 그리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한 번의 독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읽는다면 반드시 다른 시각을 또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Bookcase > 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자인의 디자인 / 하라 켄야 / 안그라픽스 (0) | 2022.02.10 |
|---|---|
| 교수대 위의 까치 / 진중권 / 휴머니스트 (0) | 2022.02.10 |
| 호모 아르텍스 / 채운 / 그린비 (0) | 2022.02.10 |
| 최후의 언어 나는 왜 찍는가 / 이상엽 / 북멘토 (0) | 2022.02.10 |
| 겹겹 / 안세홍 / 서해문집 (0) | 2022.02.10 |




댓글